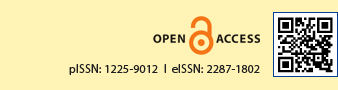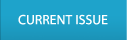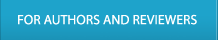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군부대 내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간호장교는 국방업무 훈령 제4조에 따라 전시 간호업무 수행 및 재난 발생 시 군, 민간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간호업무 수행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쟁, 자연, 재난, 생물 화학 대테러 등의 상황에서 간호를 수행해 왔다[1,2]. 또한 최근 메르스,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3] 재난 현장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을 근거로 파견되어 1차 의료인으로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재난 특성상 단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재난 대응에 있어 핵심 요소는 국가 차원의 사전적인 대비와 발생 시 효과적인 의료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5]. 간호사는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68.2%에 해당하는[6] 최대 규모를 보이며 피해 및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7]. 재난 상황에서 간호장교의 경우 국방부 업무훈령 제 28조 3항에 따라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대민지원을 위한 1차 파견 인력에 해당한다[1,2]. 따라서 간호장교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정확한 대응을 보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 다양한 타 부서와의 협력과 소통, 리더십 등의 임상 수행 역량이 요구된다[1,8].
재난 간호란 재난과 관련된 간호 기술과 지식을 재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 공동으로 간호사를 위한 재난간호역량(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을 발의한 바 있다. ‘예방 ․ 완화-대비-대응-복구 ․ 회복’의 4개 영역, 10개 하위 영역으로 세분되는데, 예방 ․ 완화 영역에서는 위험 감소와 질병 예방 ․ 건강증진, 정책개발과 계획을 제시하며 대비 영역에서는 윤리적 ․ 법적 실행과 책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교육과 대비를 제시했다. 대응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관리, 개인과 가족 관리, 심리적 관리, 취약 집단 관리를 말하고 있으며, 복구 ․ 회복 영역은 장기적인 개인 ․ 가족 ․ 지역사회 관리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10].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대비 단계부터 재난 발생 이후 대응 단계와 회복기로 전환되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재난 복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0,11]. 최근 COVID-19으로 인해 재난 대비, 대응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2], 간호사는 재난 환경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재난역량별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3]. 재난간호역량은 간호사의 경력[14,15], 재난 교육 경험[14–16], 재난 간호 경험[14,15]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COVID-19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장교의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난 인식이란 재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이 겪게 될 상황을 이해하는 것[17]이며, 재난 태도는 재난에 대한 행동 계획과 노력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8].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 및 훈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 국군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는 재난 경험은 재난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재난 인식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난 인식이 재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 재난 태도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19]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며 COVID-19이라는 재난 상황을 경험하고 대학 교과 과정 및 장교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군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22]으로, COVID-19 재난 이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23]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 소비의 감소[23], 간호 만족도 및 간호 업무의 효율성 증가[23,24]의 연구결과를 보였다. 현재까지 군 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과 재난간호역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군 병원 간호장교의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COVID-19 재난에 대한 대응이 장기간 진행 중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 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재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개인이 가진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11월 기준 전국에 분포한 전체 군 병원 12개소에 속해있는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모집 공고문 및 설명문, 보안성 검토 결과 및 전자 설문지 링크, QR코드(Survey monkey)를 군내 전산망으로 배포하였으며 2021년 11월 16일∼2021년 11월 22일까지 자발적 동의를 표현한 대상자에게 전자 설문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해 중간 정도의[23] 효과 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 05, 검정력(power). 95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53명이었다. 전국 12개소 근무하는 간호장교 중 자발적 연구참여자 209명의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중도 답변 거부 및 답변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191명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재난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근무경력의 2문항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재난 관련 특성은 재난간호 교육 경험, 재난간호 경험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구조화하였다.
2) 재난 인식
본 연구에서 재난 인식은 Lee [25]이 개발한 도구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총칙에 명시된 재난관리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이며 재난 책임에 대한 8문항, 재난 발생 예방과 재난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관리 현황 6문항, 재난 원인에 대한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의미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재난에 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8로 측정되었다.
3) 재난 태도
본 연구에서 재난 태도는 Moabi [18]의 재난 태도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수정 ․ 보완한 Park [19]의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이며 ‘나는 재난 계획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재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계획은 병원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재난 계획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에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등 재난 계획 필요성에 대한 수용도, 행동에 대한 민감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의 총 11문항으로 최소 11점에서 최대 44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참여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Park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7로 측정되었다.
4)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Rubin과 Martin [26]의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S)을 기반으로 Hur [27]가 보완 ․ 수정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를 이용하였으며 자기 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 등 총 15개 문항으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런편이다’까지 Likert 형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2였으며, Hur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84로 측정되었다.
5) 재난간호역량
본 연구에서는 재난간호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재난 간호 수행능력(ICN frame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과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에서 공동 개발한 44개의 문항의 Emergency Preparedness Information Questionnaire (EPIQ)을 기반으로 Noh [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재난 대비, 대응, 간호 기술 제공 및 취약한 대상자 분류를 포함한 총 15문항으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에 대한 핵심 수행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Cronbach's ⍺는 .94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90로 측정되었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윤리심의 승인(IRB No. AFMC-202111-HR-078-01) 취득 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보안성 검토 시행 후 전국 전체 12개소 군 병원 교육 장교 사전 협조를 통해 연구에 대한 모집 공고문 및 설명문, 보안성 검토 결과 및 전자 설문지 링크, QR코드(Survey monkey)를 군내 전산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2021년 11월 16일∼2021년 11월 22일까지 연구대상자를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공고 게시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전자 설문지를 통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자발성 및 목적, 방법, 결과 활용, 연구참여시 위험과 이익, 참여 중단에 대한 불이익 없음, 연구자료 보관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를 표현한 대상자에 대해서 자가 보고식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약 15분이며, 설문을 완성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했다. 총 수집된 대상자는 209부이며 불성실한 응답 18부를 제외하고 19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1.3%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간호장교의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SPSS /WIN 2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여 군 병원 간호장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의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 병원 간호장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군 병원 간호장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 역량의 차이
총 191명의 대상자 중 여성 165명(86.4%)이 참여하였다. 근무경력은 년차 이후 개월 수는 모두 올림 하였으며 1∼2년 이하 48명(25.2%), 3∼5년 이하 82명(42.9%), 6∼9년 이하 52명(27.2%), 10년 이상 9명(4.7%)이었다. 재난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49명(78%)이며 재난교육의 형태는 시뮬레이션 교육 37명(24.8%)이 가장 많았다. 재난교육을 받은 시점은 대학 교과 과정 98명(66.2%)이 가장 많았다. 재난교육 요구도는 가상 환자(Stand-ardized patient)를 이용한 재난교육 59명(39.6%)으로 가장 높았다. 재난간호 업무에 참여 경험이 없는 간호장교는 148명(77.5%)이었다. 재난간호 업무에 참여한 적 있는 간호장교는 43명(22.5%)으로 재난간호 업무 참여 형태는 COVID-19 확진자(또는 의심 환자) 진료 및 간호가 25명(5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난간호역량은 근무경력(t=3.22, p=.024), 재난간호 교육 여부(t=4.08, p<.001), 재난간호 참여 경험(t= 3.54,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6∼9년차가 1∼5년차보다 재난간호역량이 높았으며 재난간호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재난간호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Disaster Nursing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1)
2. 대상자의 재난 인식, 재난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의 정도
대상자의 재난 인식은 최대 100점 만점에 평균 73.02±7.66점(평균 평점 3.65±0.37점), 재난 태도는 최대 44점 만점에 평균 36.86±3.96점(평균 평점 3.35±0.35점), 의사소통능력은 75점 만점에 평균 57.97±6.39점(평균 평점 3.86±0.42점), 재난간호역량은 최대 75점 만점에 평균 52.88±7.66점(평균 평점 3.52 ±0.5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과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재난 인식은 재난 태도(r=.32, p=.002), 의사소통능력(r=.46, p<.001), 재난간호역량(r=.4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재난 태도는 의사소통능력(r=.28, p<.001), 재난간호역량(r=.19, p=.00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재난간호역량(r=.5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4.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명목 변수인 총근무 경력은 3∼5년차를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0’의 값을 부여하여 비교하였으며, 재난 간호 교육 경험은 ‘무’를 기준으로, 재난간호 경험 ‘무’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p<.05)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3.96 (p<.001)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 Durbin-Watson 검정 값이 1.64로 각 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으며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하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었으며 VIF 값은 1.09∼1.38로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없었다..
재난간호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β=.34, p<.001)이었으며, 재난 인식(β=.20, p=.003), 재난교육 경험(β=−.20, p=.001), 재난간호 참여 여부(β=−.14, p=.022), 총 근무경력(β=.14, p=.033)은 6∼9년차에서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이는 재난간호역량의 약 35%를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Regression for Disaster Nursing Competence (N=191)
논 의
본 연구는 재난 인식과 태도, 의사소통능력이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역량의 차이에서, 근무경력, 재난 간호 교육 여부, 재난 간호 참여 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실무에서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은 선행연구[14, 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재난 간호 교육 여부와 재난간호역량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간호사[14,15], 간호대학생[16], 간호장교 모두에게 공통으로 확인되는 결과이며 이에 따라 재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난 간호 경험과 재난간호역량의 유의한 차이는 재난 간호를 직접 수행한 실무적 경험이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Noh [1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 간호 경험을 증가시키면 재난간호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실제 재난 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한 가상 환경을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간접 경험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후속된다면 본 연구는 재난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 제도 또는 시스템 수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은 최대 75점 만점에 평균 52.88±7.66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이용한 응급실 간호사 대상 연구[19]의 평균 51.75±9.91점,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15]의 평균 45.75±8.55점보다 높았다. 한편 재난간호역량 세부 문항 중 간호 제공 기록 부분에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14,15,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간호대상자 개인의 세부적인 요소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급변하는 상태를 기록하는 것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28].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음성 및 영상 간호 기록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재난간호 기록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응급실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 및 훈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19,30] 개인이 경험하는 재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재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16].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재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았고[14,15,19] 재난 인식은 재난 간호 참여도에 긍정적 관계를 보이며 이는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다[15–16,30]. 따라서 재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재난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재난 태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재난 태도와 의사소통능력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재난 태도가 높을수록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에[19], 이에 따라 재난 대응에 활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과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없으며 변수들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반복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았다. 의사소통능력과 재난간호역량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나 재난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재난 환경 파악이 증가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29]. 또한 COVID-19 재난 이후 프로토콜화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불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 소비가 감소[23]했고, 간호 만족도 및 간호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23,24]. 또한 본 연구에서 재난간호역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으로 재난간호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명력은 약 35%였다. 재난 상황을 구현한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교육이 재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도 간접 경험을 통해 재난 상황 속에서 효과적 의사소통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난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외 재난간호역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인식, 재난 교육 여부, 재난 간호 참여 여부, 근무 경력순으로 나타났다. 재난 인식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5,16]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난교육 경험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4–16]. 이는 재난 교육이 재난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에 따라 재난 간호 교육은 재난간호역량 증진에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근무경력은 6∼9년 이하의 경우가 3∼5년 이하보다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총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높은 선행연구와 유사하다[14,15]. 군 병원 간호장교의 경우 군 병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재난 모의 상황 훈련 노출과 교육 경험의 횟수가 증가해 업무에 대한 능숙도가 향상되어 높은 재난간호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재난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기 전 주기적인 재난 교육을 통해 재난간호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시 간호장교는 업무 훈령에 따라 1차 투입되는 의료인력이므로 간호장교의 재난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교육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연구와 가상기술을 활용한 재난 인식과 태도 제고, 향상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한 재난간호역량 강화 교육은 간호장교의 재난간호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재난간호역량측정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문항은 재난상황에서 간호 제공 기록 부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전자 의무 기록 또는 수기 기록 외의 비디오 녹화 또는 음성 기록 등 다양한 간호 제공 기록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난 인식은 재난 태도,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재난 태도는 의사소통능력, 재난간호역량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은 재난간호역량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난 인식은 재난 태도의 향상 및 의사소통능력과 재난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약 35%였다. 재난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경험이나 업무적 능숙함을 익히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재난 상황을 대비한 의사소통능력은 재난간호역량의 효과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재난 간호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재난 간호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실제와 근접한 재난 상황을 구현한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AI, VR, AR, Metaverse를 활용한 가상 재난 환경이 생생하고 현실성 있는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재난간호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국 12개 군 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자로 공고문을 게시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현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다. 또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재난간호역량을 측정하였고, 조직적 특성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간호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중 남성, 재난 간호 교육 없음의 대상자 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은 개월 수를 모두 올림 하여 계급 단위로 임의 분류하였으며 근무 연차가 일정하지 않고 최고 근무경력이 29년으로 최대 4년 단위보다 범위의 차이가 크므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